
시장조사기관 ROA Group Korea는 지난 5일 일반에 공개한 무료 보고서에서 모토로라(Motorola)의 상황에 대해서 "Classic적인 요소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RAZR 이후 출시된 모든 제품이 RAZR-Like한 ‘Me, too’ 제품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Motorola는 RAZR 이후 시장을 Leading할 만한 Trend Setter를 개발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Motorola가 뚜렷하게 잘 만드는 제품이 없다는 말과 일맥 상통한다. 현재 Motorola의 단말은 시장에서의 Trend를 주도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이후 휴대폰 시장 최대 Keyword인 ‘Consumer Needs’에 전혀 부합하지 못했다.
모토로라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시장 대처 능력이 떨어졌고, 휴대전화의 원조인 모토롤라가 몰락하는 데는 1년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를 만든 모토로라가 휴대전화 사업을 접을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국내의 삼성이나 LG같은 업체들은 경쟁자가 사라져 반가워 할지도 모르지만, 만약 모토로라를 중국 업체들이 인수하면 사정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중국이 거대한 자체소비시장과 저임금을 앞세우고 거기에 모토롤라의 브랜드까지 등에 업으면 그 위력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업이나 경제적인 측면은 잘 모르지만, 개인적인 인연과 추억이 있기에 모토로라의 몰락은 아쉬움과 함께 아련한 슬픔을 느끼게 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감수해야 할 불편함도 제법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닌다면 일단 잘사는 놈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때이므로 버스를 타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삐삐와 휴대전화를 같이 들고 다니는 것에 대한 모순된 오해의 시선을 받아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에 큰 덩치를 들고 다니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요즘에 비한다면 엄청난 크기 때문에 벽돌이니 흉기니 하면서 비교되겠지만, 그 당시에 나왔던 Motorola DynaTAC 시리즈는 이전에 출시되었던 포터블 폰등에 비한다면 1Kg도 되지않는 정말 가벼운 모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휴대전화를 들고다녔던 이유는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폼을 위해서도 아니고, 휴대전화기 판매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용하던 카폰이나 트랜스포터블 셀룰러 폰(Transportable Cellular Phone)뿐만 아니라 이후에 나왔던 삼성(sch 100)과 모토로라의 휴대전화기는 그 가격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도 쉽게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모토로라의 마이크로 택 시리즈 중에서 Tac-1950인가가 출시되면서 보증보험을 이용하여 할부판매(리스)를 도입하여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말기 가격과 보증금 등을 합해서 300만원 정도에 12~24개월 할부로 계약하면, 빠르면 1주일 느리면 15일 후에 개통된 전화기를 직접 배송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만원에 살 수 있는 차량용 핸즈프리 셋트도 30만원에 설치비 3만원이 별도였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차량에 설치를 했는지 주말밤 늦게까지도 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택 시리즈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Tac-II와 Tac-III 가 나올 무렵에는 단말기 가격도 상당히 떨어져서 120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했고, 자연스럽게 휴대전화 대리점이 시내 곳곳에 등장하면서 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조립된 제품(Tac lite?)도 다량으로 수입되었고, 에릭슨이나 노키아, 삼성도 경쟁력있는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지만, 모토로라가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80~90%이상을 잠식했으리라 짐작됩니다. 모토로라의 마이크로 택 시리즈의 최대 장점은 기종과 관계없이 모두 배터리와 충전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었습니다. 삼성도 sch 600이라는 당시 최소형 단말기를 출시했지만 성능에 비해 판매량이 부진했던 이유중 하나가 이런 호환성의 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94년도에 생활지에 광고하기 위해 직접 촬영했던 Tac-III 사진입니다.
폴더를 열면 자동으로 통화와 연결되고 폴더를 닫으면 통화가 종료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모토로라만의 특허였습니다. Tac-I 의 폴더 두께가 5~8mm 정도 였는데 Tac-3는 지금처럼 얇은 형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삼성의 야심작이 었던 sch 600은 Bar 타입이었기에 흔히 말하는 뽀대가 나기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제품이 판매자들 사이에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사용자가 불이 난 집에서 꺼낸 휴대전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솔직하게 그 전에도 삼성의 제품이 한국의 지리적 특성을 잘 살렸는지 통화 성공율이 더 높은 편이 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휴대전화의 대중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제품은 바로 스타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주류를 이루던 삐삐를 한물가게 하고, 티코에서 그랜저까지 차량마다 황금색의 안테나를 유행시켰던 휴대전화의 대중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단말기의 가격은 점점 내려가서 50~60만원이었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96년 세계최초로 아날로그 방식(AMPS)보다 수용 용량이 10배가 넘고 통화품질도 우수한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면서 모토로라의 고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의 디지탈 방식의 전화기는 대부분이 Bar 타입에 아날로그와 디지탈의 겸용방식을 채택했는데, 아무래도 외국기업이다 보니 이러한 국내 흐름을 따라잡지 못한듯 대응이 늦어, 디지탈 방식의 단말기 출시가 늦어 졌습니다. 물론 스타택의 골수팬들은 그 이후까지도 스타택의 디지탈 버젼을 애호했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이나 LG의 비중이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섰고, 기반을 확고히 다진 상황이기에 예전의 절대적인 영화는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 인지도나 판매량에서 국내업체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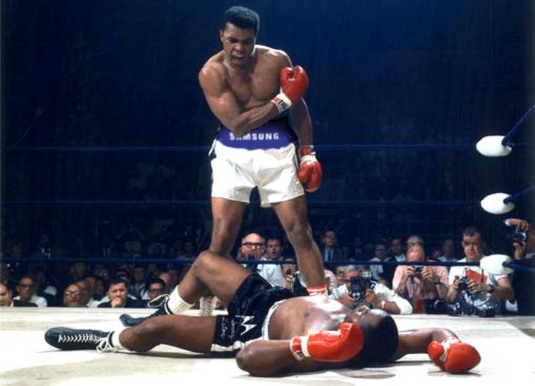
그러다가 2005년 RAZR의 초히트로 다시 한번 도약을 했지만, ROA의 지적처럼 클래식한 요소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RAZR 이후에 출시된 제품들은 너무 레이저를 닮은(RAZR-Like) 유사 제품이 돼 버렸습니다. 결국 성공한 레이저 때문에 적자를 내게 된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입니다. 모토로라는 지난달 31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략적 사업재편을 고민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모바일 사업 부분의 분할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모토로라는 지난해 4분기 중 휴대폰 판매량이 38%나 급감하는 등 실적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에드워드 잰더(Ed Zander)가 모토로라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올 1월에 그레그 브라운(Greg Brown)을 새 CEO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Carl Icahn)이 모토로라 지분을 최근 5%까지 늘리며 모토로라 경영진에게 휴대폰 사업부를 분사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였고, 모토로라는 아이칸의 내용을 검토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 전세계의 휴대폰 시장을 움직이던 모토로라의 모바일 디바이스 분사 또는 부분 매각 시도는 스스로 패배를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분사나 부분 매각으로 이어진다면, 인류 최초로 달나라에서 들려 주었던 감동도, 1973년 세계 최초로 휴대전화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기억도, 1984년 최초의 무전기형 휴대전화를 출시했던 사건도, 역사 속에 묻혀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전설같은 휴대전화 왕국의 신화가 쓸쓸하게 막을 내리는 모습을 곧 볼지도 모르겠네요.

에릭슨이 인수할지 중국이 인수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내 기억속의 모토로라는 아니겠지요?
HELLO MOTO
'이런저런 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관희 파문은 언제까지? (15) | 2008.02.17 |
|---|---|
| 옥션 해킹사건은 잊혀지려나? (34) | 2008.02.17 |
| 가장 오래된 직업 (12) | 2008.02.15 |
| 진관희 파문과 진문원 파혼 (12) | 2008.02.08 |
| 해커들의 놀이터가 된 한국의 쇼핑몰 (55) | 2008.02.06 |
| 진관희(陳冠希)의 사과 동영상 (14) | 2008.02.05 |
| 브리트니, 노래 그대로 Toxic 인지.. (36) | 2008.02.04 |
| 임경진은 애교로 봐주자 (23) | 2008.02.02 |


